
지난달 중순, 블룸버그가 중국 베이징에서 채권 설명회를 엽니다. 좋은 매물이 있으니 관심 있는 이들 오라고 했고, 중국의 내로라하는 채권 '큰 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매물은 한국 국채 였습니다.
WGBI 효과 덕이었습니다. 세계국채지수,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의 하나입니다. 해외 연기금 등 대형 투자자들은 이 지수에 포함된 국채 위주로 사들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국이 포함돼 있지만, 한국은 4수 끝에 지난해 10월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100 중에 미국 국채가 40, 일본 10 정도인데, 한국 국채 비중은 2.22로 정해졌습니다.
내년 4월부터 편입이 시작돼 내년 11월에 한국 비중 2.22%를 채울 예정입니다. 채권 시장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좋든 싫든 한국 국채를 곧 사들여야 하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하죠. 한국 정부도 판촉에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3월에는 세계 투자자 130여 명을 상대로 온라인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현지에 가서 오프라인 설명회까지 연 겁니다.
■ "한국 국채 1~2년 안 투자"
지난달 16일 열린 설명회 이름은 '한국 국채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
한국에서는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이 직접 갔습니다. 현장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재정 건전성, 그리고 수익률 등을 강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KBS는 복수의 참석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블룸버그의 왕다하이 북아시아 지역 총괄은 "주로 중국 증권사와 은행, 트레이더들이 참석했고, 서울과 홍콩에서 참석한 전문가들도 있었다"며 "한국 국채 시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선 '한국 국채를 살 거냐? 언제 살거냐?'를 묻는 설문도 이뤄졌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향후 1~2년 안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참가자가 한국의 국채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 채권 시장에서 한국 국채는 아직 '신상품'입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등 기본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선 거래 절차 등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꽤 오갔습니다.
왕 총괄은 "기존 거래 인프라와 최근 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통합(옴니버스) 계좌'와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채 시장의 접근성을 더 높이면 좋겠다는 '위시 리스트(wish-list)'도 공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월 발간된 블룸버그-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보고서를 냅니다. 해외 투자자 3백여 명에게 한국 국채 투자를 위해 필요한 환경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8%는 아무 조건 없이도 진입하겠다 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32%가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고채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로클리어는 국제적인 예탁결제기구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선진 국채 시장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려면 이래야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보관은행을 선임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 계좌를 통해서만 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되게 귀찮고 까다로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간편해졌습니다. 유로클리어의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계좌를 이용해 간편하게 거래와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27%가 오프쇼어 시장 거래 가능성(원화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의 국가, 즉 역외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을지)을 꼽았고, WGBI 편입이라고 답한 투자자는 15% 뿐이었습니다.
종합하면, 거래하기 더 편하기 해줘야 더 투자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국채를 거래하고 있는 응답자들 역시, 역외 외환 거래의 어려움 등 때문에 향후 1~2년 안에 거래 규모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티븐추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수석 전략가는 " 외환시장 개혁이 원화의 국제화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외환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늘렸고, 역외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 외환시장 접근도 허용했습니다. 스티븐추는 이런 개혁이 "MSCI가 한국 증시를 선진 시장으로 분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는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을 촉진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MSCI 선진국 지수 MSCI는 모건스탠리 산하의 금융 정보와 지수 제공 기업입니다. 선진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종목으로 구성된 MSCI 선진국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여러 제약 요건이 많다며 선진국지수가 아닌 신흥국지수에 편입돼 있는데, 지난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MSCI 최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이러한 선진국지수 편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 중국은 왜 한국 국채에 눈독?
중국은 세계 채권 시장의 '큰 손'입니다. 중국이 세계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도 대규모로 들고 있지만, 최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2013년엔 미국 국채를 무려 1조 3,100여 달러, 우리 돈으로 1,843조 원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정점으로 2022년 4월엔 1조 달러 아래로 줄였고, 이후 매년 수백억 달러씩 보유액을 줄여 지난 2월 기준으로 약 7,84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큰 손'이 미국 국채를 덜 사면,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채 가격이 싸진다는 건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는 이자를 더 갚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우리 돈으로 5경 원이 넘는 36조 달러. 금리가 0.1%p(포인트)만 올라도 이자를 50조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이러니 음모론도 나옵니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하려 일부러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정말 음모론처럼 미국 정부를 괴롭게 할 목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덜 보유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최근 달러에 대한, 아니 미국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가 달러 의존도를 조절합니다. 의존도가 너무 크면,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환율 정책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국채의 효용성이 나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국채를 팔면, 다른 나라 국채를 사야합니다. 당연히 EU나 일본 등 경제 대국 위주로 사겠지만, WGBI에 편입된 만큼 이제 한국 국채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하나입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장기전략리서치부장은 " 기본적으로 자국과 통상·무역이 많은 나라의 통화 익스포저(노출)를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권 매수를 통한 환율 조절 기능도 생길 것이고, 교역 규모가 크니 환 변화 위험이 생길 때 일종의 안전한 자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살 수 있다. 외환 시장이 움직일 때 일종의 안전판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국채를 사려면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외환 시장에서 원화 수요가 늘테고,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됩니다.
중국 입장에선 위안화가 너무 약해지면, 한국과 무역하는 데 곤란해집니다. 이럴 때는 원화로 된 한국 국채를 팔아 위안화로 다시 환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교역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출과 수입에 적용되는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2월까지 한국 국채를 어느 나라가 많이 들고 있는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마지막 통계를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 정부가 찍어낸 국채의 18% 정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 국채 잘 팔리면, 뭐가 좋지?
WGBI 편입 이전에도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지난해 한국 국채 투자가 1년 전보다 19조 4천억 원 늘어,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사상 최고치인 22.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추 수석 전략가는 "지난 2월 기준, 한국 국고채의 총수익률은 3.8%로 아시아 내 국채 가운데 가장 높고 미국 국채보다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의 중앙은행 등이 한국 국채를 '사랑'한다"고도 표현했는데, 한국 국채 보유자의 절반 정도가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 수도 2006년 19개국에서 2020년 47개국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를 많이 사주면 뭐가 좋을까요.
국채는 말 그대로 '나라가 돈 필요할 때 내는 빚'이죠. 공동락 부장은 "국가 채무 부담을 분배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진단 거니,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국내 투자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분산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채 금리도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회사채 등 시장 금리도 떨어질 압력이 쌓입니다. 대출 금리도 낮아질 수 있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돈이 더 잘 돌 수 있습니다.
반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많이 산다는 건 원화를 많이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한국 시장을 이탈할 순간이 오면, 환율 출렁임이 더 커질 위험도 있는 겁니다.
WGBI 편입은 내년 4월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560억 달러, 약 70조 원 이상의 해외 자금이 한국 국채를 더 사들일 거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중국의 채권 '큰 손'들이 사들일까요. 그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친소 관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단순한 투자처를 넘어, 외환시장 선진화를 비롯한 각국의 전략이 얽힌 국채 시장. 이 흐름을 들여다보면, 지금 한국이 세계 금융질서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은 왜 ‘한국 국채’에 눈독 들일까
-
- 입력 2025-05-06 07:01:43

지난달 중순, 블룸버그가 중국 베이징에서 채권 설명회를 엽니다. 좋은 매물이 있으니 관심 있는 이들 오라고 했고, 중국의 내로라하는 채권 '큰 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매물은 한국 국채 였습니다.
WGBI 효과 덕이었습니다. 세계국채지수,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의 하나입니다. 해외 연기금 등 대형 투자자들은 이 지수에 포함된 국채 위주로 사들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26개국이 포함돼 있지만, 한국은 4수 끝에 지난해 10월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100 중에 미국 국채가 40, 일본 10 정도인데, 한국 국채 비중은 2.22로 정해졌습니다.
내년 4월부터 편입이 시작돼 내년 11월에 한국 비중 2.22%를 채울 예정입니다. 채권 시장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좋든 싫든 한국 국채를 곧 사들여야 하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하죠. 한국 정부도 판촉에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3월에는 세계 투자자 130여 명을 상대로 온라인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현지에 가서 오프라인 설명회까지 연 겁니다.
■ "한국 국채 1~2년 안 투자"
지난달 16일 열린 설명회 이름은 '한국 국채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
한국에서는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이 직접 갔습니다. 현장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재정 건전성, 그리고 수익률 등을 강조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KBS는 복수의 참석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블룸버그의 왕다하이 북아시아 지역 총괄은 "주로 중국 증권사와 은행, 트레이더들이 참석했고, 서울과 홍콩에서 참석한 전문가들도 있었다"며 "한국 국채 시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선 '한국 국채를 살 거냐? 언제 살거냐?'를 묻는 설문도 이뤄졌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향후 1~2년 안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참가자가 한국의 국채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 채권 시장에서 한국 국채는 아직 '신상품'입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등 기본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선 거래 절차 등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꽤 오갔습니다.
왕 총괄은 "기존 거래 인프라와 최근 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통합(옴니버스) 계좌'와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채 시장의 접근성을 더 높이면 좋겠다는 '위시 리스트(wish-list)'도 공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월 발간된 블룸버그-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보고서를 냅니다. 해외 투자자 3백여 명에게 한국 국채 투자를 위해 필요한 환경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48%는 아무 조건 없이도 진입하겠다 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32%가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국고채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로클리어는 국제적인 예탁결제기구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선진 국채 시장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려면 이래야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보관은행을 선임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 계좌를 통해서만 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되게 귀찮고 까다로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간편해졌습니다. 유로클리어의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됐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계좌를 이용해 간편하게 거래와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27%가 오프쇼어 시장 거래 가능성(원화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의 국가, 즉 역외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을지)을 꼽았고, WGBI 편입이라고 답한 투자자는 15% 뿐이었습니다.
종합하면, 거래하기 더 편하기 해줘야 더 투자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국채를 거래하고 있는 응답자들 역시, 역외 외환 거래의 어려움 등 때문에 향후 1~2년 안에 거래 규모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티븐추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수석 전략가는 " 외환시장 개혁이 원화의 국제화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외환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늘렸고, 역외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 외환시장 접근도 허용했습니다. 스티븐추는 이런 개혁이 "MSCI가 한국 증시를 선진 시장으로 분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는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을 촉진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MSCI 선진국 지수 MSCI는 모건스탠리 산하의 금융 정보와 지수 제공 기업입니다. 선진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종목으로 구성된 MSCI 선진국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여러 제약 요건이 많다며 선진국지수가 아닌 신흥국지수에 편입돼 있는데, 지난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MSCI 최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이러한 선진국지수 편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 중국은 왜 한국 국채에 눈독?
중국은 세계 채권 시장의 '큰 손'입니다. 중국이 세계 채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도 대규모로 들고 있지만, 최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2013년엔 미국 국채를 무려 1조 3,100여 달러, 우리 돈으로 1,843조 원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정점으로 2022년 4월엔 1조 달러 아래로 줄였고, 이후 매년 수백억 달러씩 보유액을 줄여 지난 2월 기준으로 약 7,84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큰 손'이 미국 국채를 덜 사면,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채 가격이 싸진다는 건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는 이자를 더 갚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우리 돈으로 5경 원이 넘는 36조 달러. 금리가 0.1%p(포인트)만 올라도 이자를 50조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이러니 음모론도 나옵니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하려 일부러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정말 음모론처럼 미국 정부를 괴롭게 할 목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덜 보유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최근 달러에 대한, 아니 미국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가 달러 의존도를 조절합니다. 의존도가 너무 크면,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환율 정책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 국채의 효용성이 나옵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국채를 팔면, 다른 나라 국채를 사야합니다. 당연히 EU나 일본 등 경제 대국 위주로 사겠지만, WGBI에 편입된 만큼 이제 한국 국채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하나입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장기전략리서치부장은 " 기본적으로 자국과 통상·무역이 많은 나라의 통화 익스포저(노출)를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권 매수를 통한 환율 조절 기능도 생길 것이고, 교역 규모가 크니 환 변화 위험이 생길 때 일종의 안전한 자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살 수 있다. 외환 시장이 움직일 때 일종의 안전판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국채를 사려면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외환 시장에서 원화 수요가 늘테고,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가 됩니다.
중국 입장에선 위안화가 너무 약해지면, 한국과 무역하는 데 곤란해집니다. 이럴 때는 원화로 된 한국 국채를 팔아 위안화로 다시 환전하면 됩니다. 이렇게 교역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출과 수입에 적용되는 환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2월까지 한국 국채를 어느 나라가 많이 들고 있는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마지막 통계를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 정부가 찍어낸 국채의 18% 정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 국채 잘 팔리면, 뭐가 좋지?
WGBI 편입 이전에도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지난해 한국 국채 투자가 1년 전보다 19조 4천억 원 늘어,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이 사상 최고치인 22.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추 수석 전략가는 "지난 2월 기준, 한국 국고채의 총수익률은 3.8%로 아시아 내 국채 가운데 가장 높고 미국 국채보다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의 중앙은행 등이 한국 국채를 '사랑'한다"고도 표현했는데, 한국 국채 보유자의 절반 정도가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 수도 2006년 19개국에서 2020년 47개국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를 많이 사주면 뭐가 좋을까요.
국채는 말 그대로 '나라가 돈 필요할 때 내는 빚'이죠. 공동락 부장은 "국가 채무 부담을 분배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진단 거니,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재정 부담을 국내 투자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분산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채 금리도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회사채 등 시장 금리도 떨어질 압력이 쌓입니다. 대출 금리도 낮아질 수 있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돈이 더 잘 돌 수 있습니다.
반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많이 산다는 건 원화를 많이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한국 시장을 이탈할 순간이 오면, 환율 출렁임이 더 커질 위험도 있는 겁니다.
WGBI 편입은 내년 4월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560억 달러, 약 70조 원 이상의 해외 자금이 한국 국채를 더 사들일 거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얼마나 중국의 채권 '큰 손'들이 사들일까요. 그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친소 관계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단순한 투자처를 넘어, 외환시장 선진화를 비롯한 각국의 전략이 얽힌 국채 시장. 이 흐름을 들여다보면, 지금 한국이 세계 금융질서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짐작해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
-

김지숙 기자 vox@kbs.co.kr
김지숙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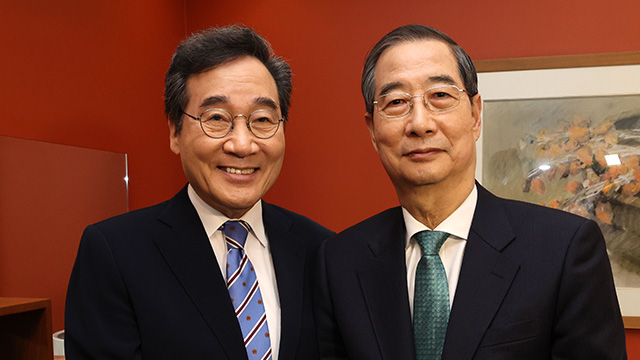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