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아동학대 신고자들 “그럼에도 신고한다”…이유는?
입력 2021.01.16 (08:01)
수정 2021.01.16 (0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가장 주목받지 못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신고자들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 대단한 용기를 낸 이들이지만 현실에서는 따가운 눈살은 물론, 격한 항의를 받기도 해 노출에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BS 취재진은 그들의 경험에서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교사, "아이를 눈앞에서 놓치는 것, 그게 제일 무서워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민영 씨(가명)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건 보복 위협이나 손가락질보다도 '아이가 내 손을 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6년 전 김 씨는 부모로부터 심하게 맞은 학생을 대신해 아동학대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신고 사실이 부모에게 전달되면 더 심하게 맞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보호자의 폭력성은 심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사 과정에서 학대 학생의 보호자는 김 씨가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김 씨가 현실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가 '결국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겠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생각을 바꾸더라"라며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 부모에 대한 처벌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 순간 아이는 잡았던 제 손을 놓더라"라고 울먹였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처벌보다 예방과 조기발견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집, 학원 외에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수록 아이들은 더 빨리 구조되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 역시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결국 아이가 부모와 분리되더라도 아이의 일상이 유지되려면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김 씨는 호소했습니다.
■ 의사, "아동학대 의심 피해아동에 의학적 평가 이뤄져야"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평가를 받습니다.
아이의 진술과 부모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상처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진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아이의 눈 바로 옆 달걀 하나 크기의 멍과 붓기를 본 의사 박선호 씨(가명). 박 씨는 눈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종합병원을 안내했지만 부모는 '종합병원에서 문제 없다고 했다'며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작은 외과를 방문한 뒤 박 씨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박 씨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실수로 박 씨의 신분이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노출돼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런 곤욕을 치른 자기 자신보다 아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했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진료한 사람은 박 씨였지만, 경찰은 아이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따로 묻거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처럼 아동학대 역시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박 씨는 이야기합니다.
박 씨는 "아동학대를 포함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으며 의사들은 이를 '국가고시'를 통해 평가받는다"라며 "의료인에게 전문적 지식이 있는데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의무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나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 이웃, "자주, 반복적으로 울면 신고하라면서요?"
지인을 대신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한별 씨(가명)는 옳은 행동을 하고도 스스로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경찰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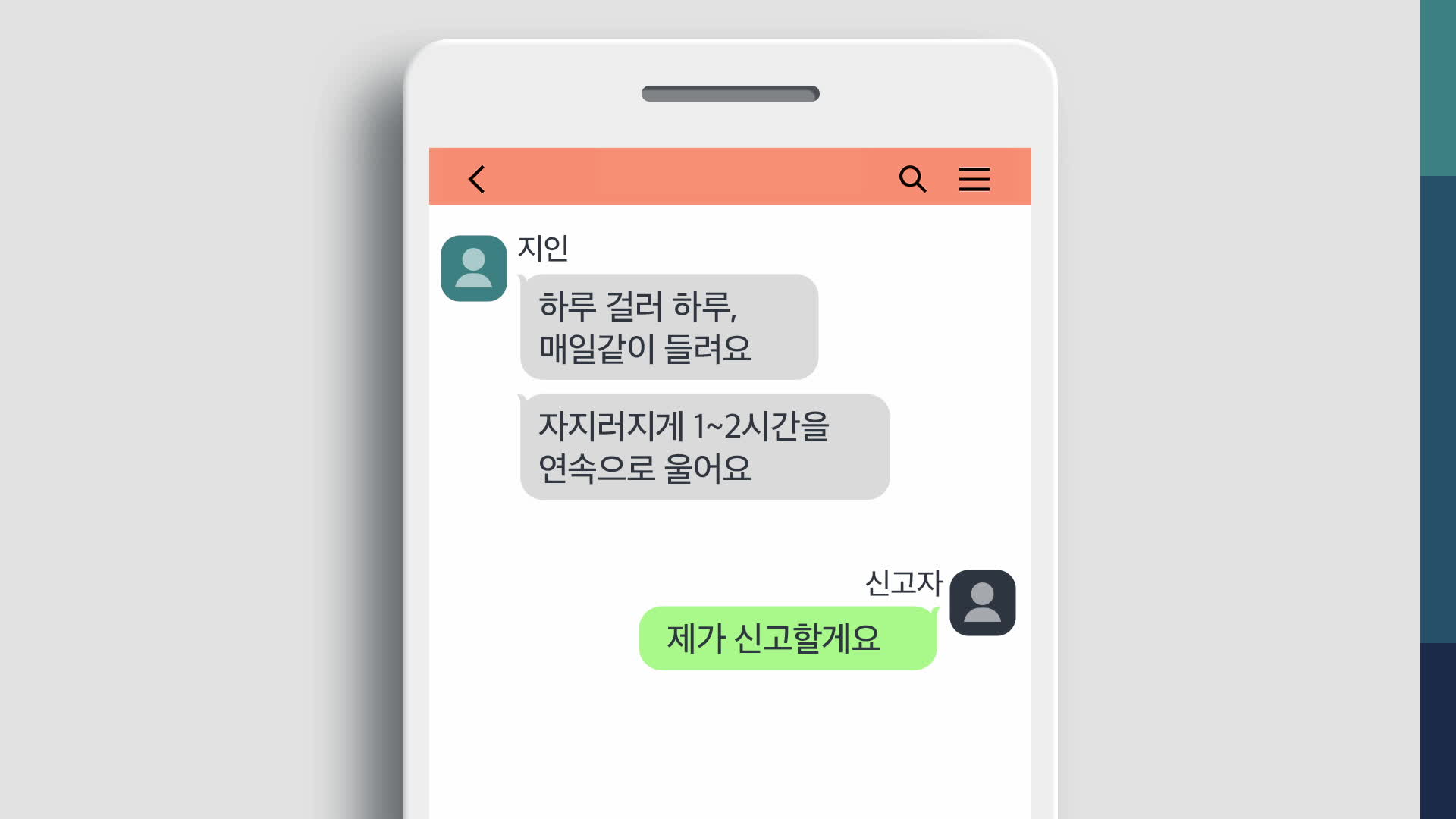
이 씨가 지인으로부터 녹음파일을 건네받은 것은 지난주 11일입니다. 녹음파일에서는 아이의 자지러지는 듯한 울음소리와 보호자의 고성, '쿵쿵'거리는 소리 등이 들렸습니다.
하루걸러 하루, 매일같이 반복된다는 말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울음소리는 아이의 몸 수색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때리는 소리'는 없냐는 황당한 물음이었습니다. 무언가에 계속 부딪히거나 충격이 가해지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데도 말입니다.
이 씨가 아이의 몸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재촉하자 '겉은 육안으로 봤고 몸 안은 나중에 볼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아이 부모의 민원이 심하다'는 불필요한 설명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씨가 SNS를 통해 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경찰에 보냈지만, 4일째 확인조차 안 됐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아이의 울음소리였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경찰은 '누가 학대라고 했냐'며 소리를 지르는 보호자의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학대가 아니면 다행인 건데 왜 그런 반응인지 모르겠다"라며 "녹음파일을 듣고 생각난 게 경찰인데, 그런 일을 겪으면 경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현명히 잘 대응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허탈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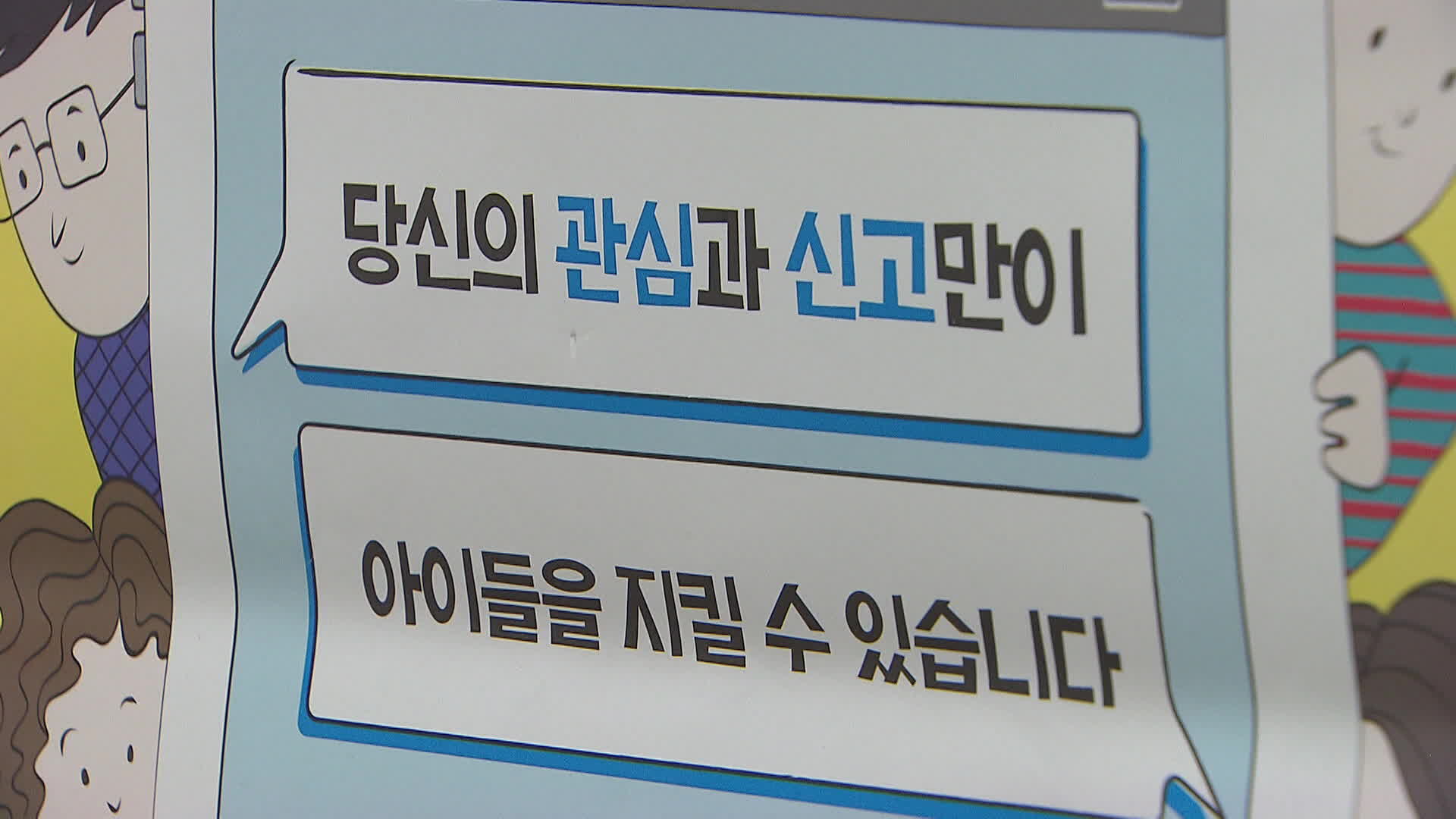
■ 그럼에도 우리의 답은….
이외에도 컨트롤타워의 부재, 매뉴얼 미숙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미흡한 점을 꼽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에 나선 이들은 '그럼에도 매뉴얼에 따라 계속 신고하겠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답은 언제나 '신고'입니다.
이제는 그 신고가 아이를 구할 수 있길, 더는 몇 번의 신고에도 놓쳤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후] 아동학대 신고자들 “그럼에도 신고한다”…이유는?
-
- 입력 2021-01-16 08:01:07
- 수정2021-01-16 08:01:36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가장 주목받지 못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신고자들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 대단한 용기를 낸 이들이지만 현실에서는 따가운 눈살은 물론, 격한 항의를 받기도 해 노출에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BS 취재진은 그들의 경험에서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교사, "아이를 눈앞에서 놓치는 것, 그게 제일 무서워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민영 씨(가명)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건 보복 위협이나 손가락질보다도 '아이가 내 손을 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6년 전 김 씨는 부모로부터 심하게 맞은 학생을 대신해 아동학대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이는 신고 사실이 부모에게 전달되면 더 심하게 맞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보호자의 폭력성은 심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사 과정에서 학대 학생의 보호자는 김 씨가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김 씨가 현실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이가 '결국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겠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생각을 바꾸더라"라며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 부모에 대한 처벌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 순간 아이는 잡았던 제 손을 놓더라"라고 울먹였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처벌보다 예방과 조기발견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집, 학원 외에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수록 아이들은 더 빨리 구조되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 역시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결국 아이가 부모와 분리되더라도 아이의 일상이 유지되려면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김 씨는 호소했습니다.
■ 의사, "아동학대 의심 피해아동에 의학적 평가 이뤄져야"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평가를 받습니다.
아이의 진술과 부모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상처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진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아이의 눈 바로 옆 달걀 하나 크기의 멍과 붓기를 본 의사 박선호 씨(가명). 박 씨는 눈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종합병원을 안내했지만 부모는 '종합병원에서 문제 없다고 했다'며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작은 외과를 방문한 뒤 박 씨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박 씨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실수로 박 씨의 신분이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노출돼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런 곤욕을 치른 자기 자신보다 아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했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진료한 사람은 박 씨였지만, 경찰은 아이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따로 묻거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처럼 아동학대 역시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박 씨는 이야기합니다.
박 씨는 "아동학대를 포함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으며 의사들은 이를 '국가고시'를 통해 평가받는다"라며 "의료인에게 전문적 지식이 있는데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의무적으로 병원에 데려가 검사나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 이웃, "자주, 반복적으로 울면 신고하라면서요?"
지인을 대신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한별 씨(가명)는 옳은 행동을 하고도 스스로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경찰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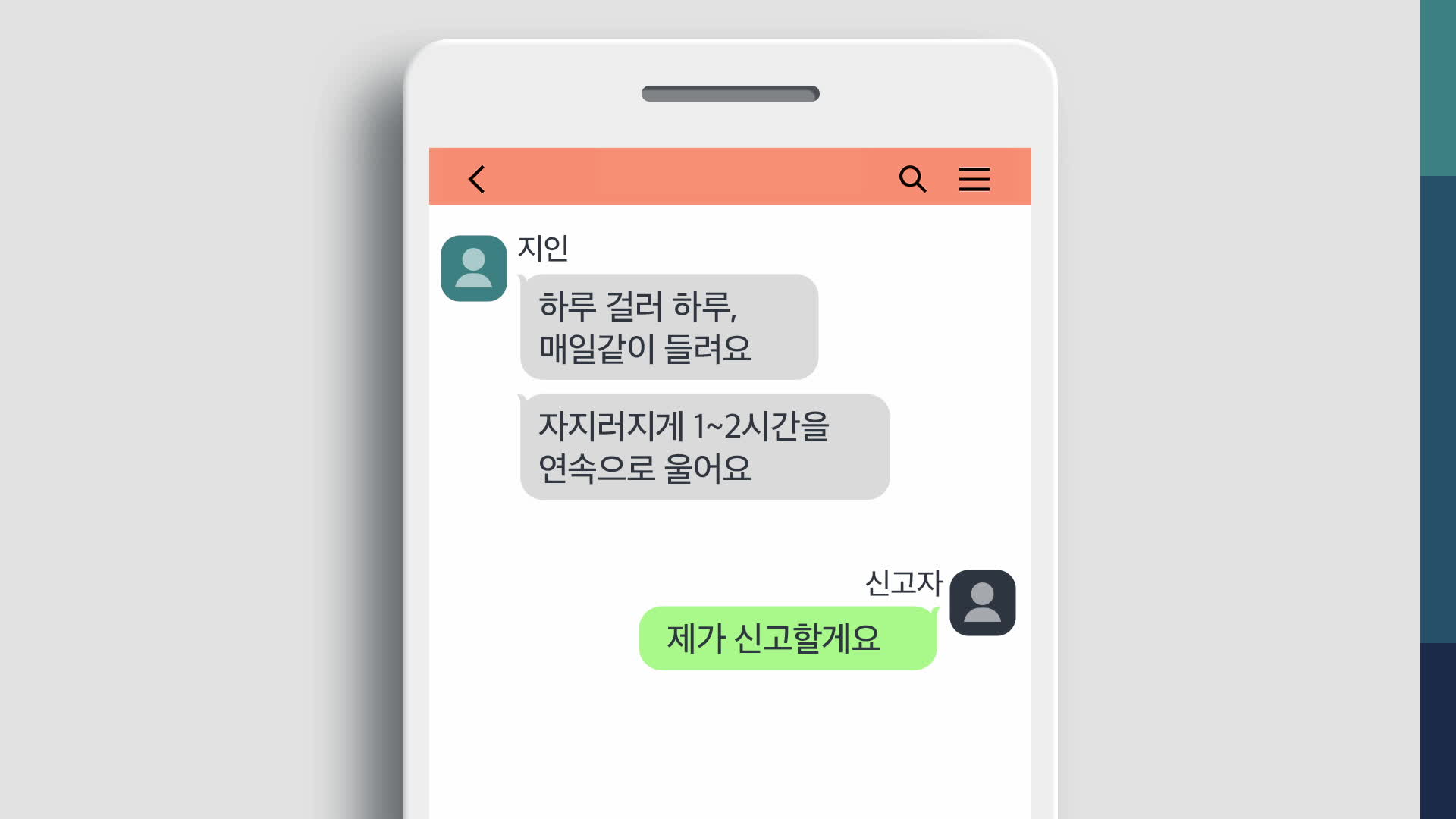
이 씨가 지인으로부터 녹음파일을 건네받은 것은 지난주 11일입니다. 녹음파일에서는 아이의 자지러지는 듯한 울음소리와 보호자의 고성, '쿵쿵'거리는 소리 등이 들렸습니다.
하루걸러 하루, 매일같이 반복된다는 말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울음소리는 아이의 몸 수색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때리는 소리'는 없냐는 황당한 물음이었습니다. 무언가에 계속 부딪히거나 충격이 가해지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데도 말입니다.
이 씨가 아이의 몸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재촉하자 '겉은 육안으로 봤고 몸 안은 나중에 볼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아이 부모의 민원이 심하다'는 불필요한 설명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씨가 SNS를 통해 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경찰에 보냈지만, 4일째 확인조차 안 됐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아이의 울음소리였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경찰은 '누가 학대라고 했냐'며 소리를 지르는 보호자의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학대가 아니면 다행인 건데 왜 그런 반응인지 모르겠다"라며 "녹음파일을 듣고 생각난 게 경찰인데, 그런 일을 겪으면 경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현명히 잘 대응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허탈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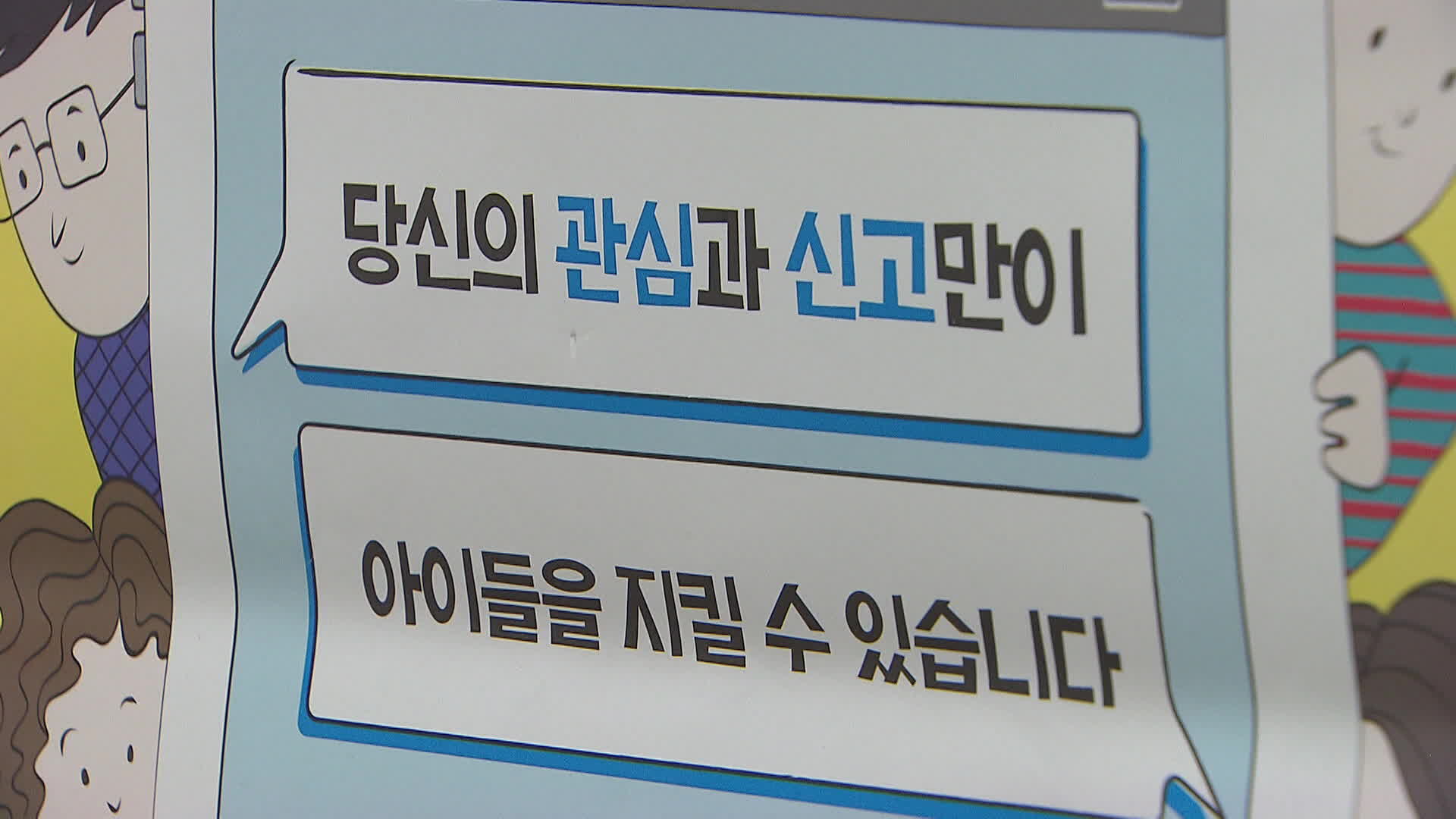
■ 그럼에도 우리의 답은….
이외에도 컨트롤타워의 부재, 매뉴얼 미숙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미흡한 점을 꼽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에 나선 이들은 '그럼에도 매뉴얼에 따라 계속 신고하겠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답은 언제나 '신고'입니다.
이제는 그 신고가 아이를 구할 수 있길, 더는 몇 번의 신고에도 놓쳤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조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